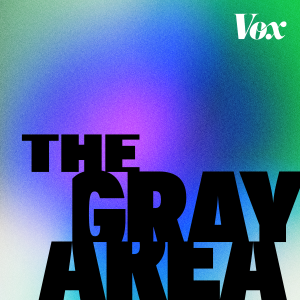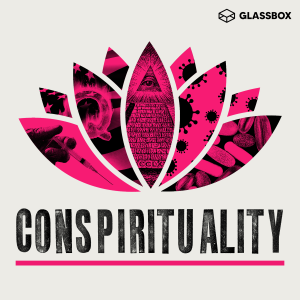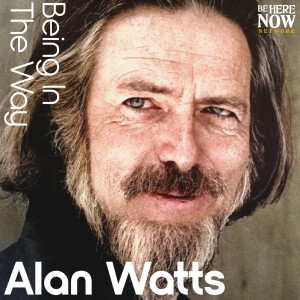이인로李仁老(1152-1220), ⟪역주 破閑集⟫
- “그래서 옛 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를 가졌더라도 감히 함부로 시문을 짓지 않았다. 반드시 단련하고 탁마하는 공력을 들인 뒤에야 글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워져 영원히 빛을 발하게 하였다.”
- 손으로 두드린다는 ‘고’敲와 밀다는 ‘퇴’推당나라 시인 가도賈島가 길을 가다가 시상이 떠올라 “새는 연못가 나무에 깃들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민다.”(鳥宿池邊樹 僧推月下門)라는 시 두 구를 지었는데 밀다와 두드리다 가운데 어느 글자를 써야 할지 몰라 골똘히 생각하다가 한유韓愈의 행차 길과 맞닥뜨렸다. 가도가 한유 앞으로 나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한유는 노여워하는 기색도 없이 한참 생각하더니, “역시 민다는 퇴보다는 두드린다는 고가 좋겠군.” 하며 가도와 나란히 하여 길을 갔다. ‘이응의 그윽한 거처에 붙임’(題李凝幽居)“한가롭게 사니 이웃도 적은데, / 풀길은 거친 정원으로 들어간다. / 새는 연못가 나무에 깃들고, / ...
이인로李仁老(1152-1220), ⟪역주 破閑集⟫
- “그래서 옛 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를 가졌더라도 감히 함부로 시문을 짓지 않았다. 반드시 단련하고 탁마하는 공력을 들인 뒤에야 글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워져 영원히 빛을 발하게 하였다.”
- 손으로 두드린다는 ‘고’敲와 밀다는 ‘퇴’推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가 길을 가다가 시상이 떠올라 “새는 연못가 나무에 깃들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민다.”(鳥宿池邊樹 僧推月下門)라는 시 두 구를 지었는데 밀다와 두드리다 가운데 어느 글자를 써야 할지 몰라 골똘히 생각하다가 한유韓愈의 행차 길과 맞닥뜨렸다. 가도가 한유 앞으로 나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한유는 노여워하는 기색도 없이 한참 생각하더니, “역시 민다는 퇴보다는 두드린다는 고가 좋겠군.” 하며 가도와 나란히 하여 길을 갔다.
‘이응의 그윽한 거처에 붙임’(題李凝幽居)
“한가롭게 사니 이웃도 적은데, / 풀길은 거친 정원으로 들어간다. / 새는 연못가 나무에 깃들고, /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 들 빛은 다리를 지나 나뉘고 / 구름은 바위를 옮기듯이 움직인다. / 잠시 갔다가 여기 다시 온 것은 / 그윽한 기약을 저버릴 수 없어서”(閒居隣竝少 草徑入荒園 鳥宿池邊樹 僧敲月下門 過橋分野色 移石動雲根 暫去還來此 幽期不負言)
Comments (3)
More Episodes
All Episodes>>Create Your Podcast In Minutes
- Full-featured podcast site
- Unlimited storage and bandwidth
- Comprehensive podcast stats
- Distribute to Apple Podcasts, Spotify, and more
- Make money with your podcast
It is Free